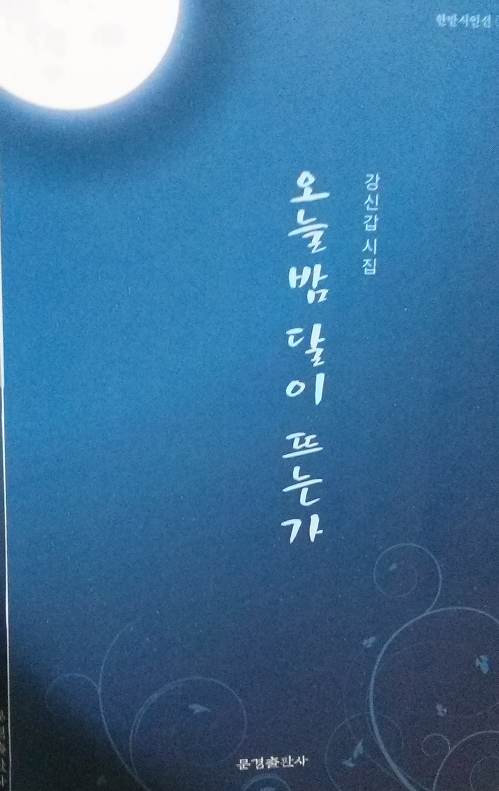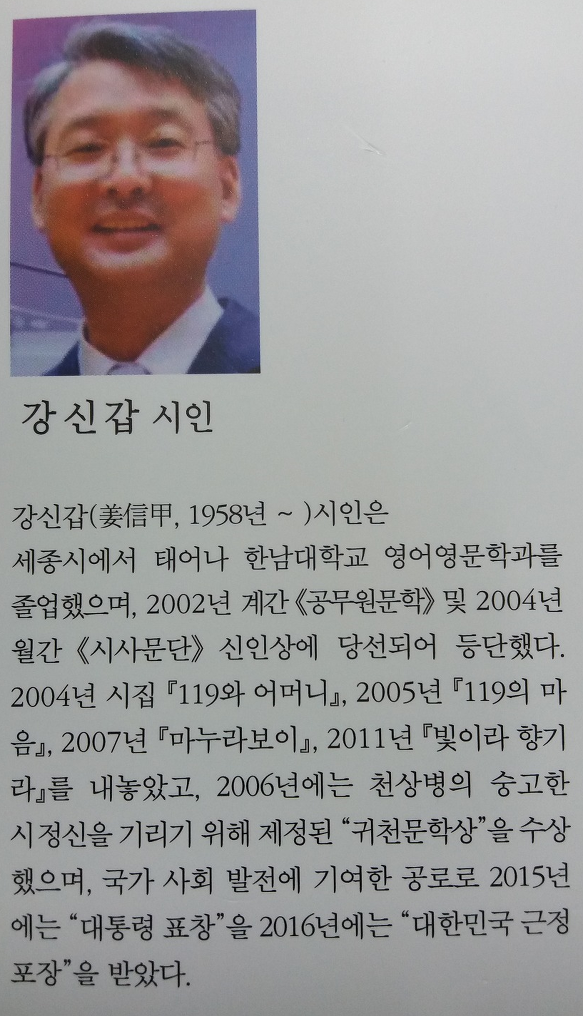시집 ‘오늘 밤 달이 뜨는가’에 부쳐
누가 나를 장난삼아 시인이라고 부를 때는 뱀을 보는 것 같고 귓전에 모기가 대드는 것 같기도 하다. 더욱이 어떤 연유로 시나 한 수 읊어 보라는 청을 받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물론 그 자리에서 발끈하여 나를 시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거나 시 쓰는 것을 가벼운 음풍농월(吟風弄月)쯤으로 알지 말라는 경고를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내 몸 꽉꽉 쥐어짜면 무엇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 그 즙이면 영혼에 담겨 익어가는 아름다운 시상과 영롱한 순정으로 맑은 하늘 잔잔한 바람에 주옥같은 사랑을 물들일 것만 같았다. 내 몸 쥐어짜면 나 떠난 뒤에도 영원히 살아남을 마음의 산물로 승화되던 사색이 뚝뚝 듣을 것만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내 안의 것을 세상에 날려 보내는 시집 ‘오늘 밤 달이 뜨는가’는 62편의 졸시(拙詩)로 재주가 부족한 나로서는 정녕 온몸 저린 환희에 찬 추출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은 붙잡는 사람의 몫이겠지만 결코 아름답기만 하다거나 영롱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악취가 나기도 하고 쓰디쓴 맛을 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밤 달이 뜨는가’의 시집이 누리에 한줄기 소나기라도 되었으면 하는 진솔한 바람은 감출 수 없다.
시는 나의 정신적 견고한 지주인 듯하다. 표현하고자 하는 시어를 발굴하고 취사선택하기 위해 집중하며 치열해하지만 시작(詩作)은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시를 조탁하고 만드는 순간이 나의 행복이요 시를 쓰는 이유이다.
빛나는 눈밭을 가는 새해 아침처럼 시계(詩界)의 무대에서 순수한 정조와 생명의 존엄을 수놓아 꽃피우려는 노력이 어렵다기보다는 위안이요 지대한 희망이다. 톱날 같은 기계화와 목석같은 정보화의 파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저 밑바닥 내면의 인간애를 찾아 뿌린다. 굳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詩學)에서 설파한 카타르시스(catharsis)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 독자라도 닫힌 가슴이 열리고 일어서는 용기를 갖게 된다면 밑씻개로 쓰일지언정 ‘오늘 밤 달이 뜨는가’는 축복이 배가되는 것으로 미력하나마 잠시 다리를 폈다가 더 큰 부지깽이를 잡을 수 있겠다.